
[TV리포트 칸(프랑스)=김수정 기자] 배우 스티븐 연은 영화 ‘버닝'(이창동 감독)으로 재발견됐다. 한국영화에서 교포, 외국인으로 인식됐던 그는 ‘버닝’에서 온전히 한국인으로 자리했다. 그가 한국어 연기도, 그것도 아주 훌륭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제71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버닝’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세 젊은이 종수(유아인), 벤(스티븐 연), 해미(전종서) 사이에 벌어지는 미스터리 한 사건을 그린 작품. ‘밀양’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전도연), ‘시’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의 신작이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창동 감독님 영화를 물론 하고 싶었지만, 제가 망칠까 봐 겁났죠. 한국어 때문이었죠. 제가 완전히 한국인이 아니니까 한국어의 뉘앙스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을 뵙고나서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감독님을 믿고 따라갔죠. 유아인도 많이 도와줬고요.”
‘버닝’의 엔딩크레딧에는 스티븐 연이 아닌 ‘연상엽’이란 이름이 뜬다. 스티븐 연이 먼저 제안한 일. 그는 배급사에 마케팅에도 스티븐 연 대신 연상엽이란 이름을 쓰고 싶다했다는 후문. 늘 교포 역할만 제안받던 그에게 ‘버닝’의 벤 역할은 어떤 갈증을 해갈해준 기회였다.
“저는 한국어 이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감독님도 동의했죠. 저는 한국에 주로 가족을 만나러 오는데, 가족들은 저를 상엽이라고 부르니까. 스티븐 연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건 8년 전부터죠. 얼마 안 됐어요.”
칸(프랑스)=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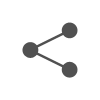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