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수정 기자] 영화 ‘특별시민’은 권력에 대한 영화다. 데뷔작 ‘모비딕’으로 기자 세계를 조명한 박인제 감독은 ‘특별시민’으로 정치, 그리고 권력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선거판을 무대로, 꿈틀 대는 욕망의 맨얼굴을 독창적인 디테일로 가득한 정치영화 틀 안에서 풀어냈다. 최근 거푸집으로 찍어낸 듯 닮아 있는 한국 상업영화 안에서 유독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 정치 생태계를 사실감 있게 그려낸 ‘특별시민’은 의도치 않게 조기 대선과 맞물려 개봉하게 됐다. 영화 속 네거티브 정치, 후보 단일화, 헐뜯기가 난무한 TV토론회는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지겹도록 봐왔던 모습이다. 치열한 권력욕으로 들끓는 정치판을 밀도 높은 긴장감과 블랙코미디를 장착해 잘 만든 상업영화로 완성해냈다.
박인제 감독과 만나 영화에 숨은 디테일, 소름 끼치는 열연을 펼친 배우들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다음은 박인제 감독과 일문일답
-의도치 않게 조기대선과 맞물려 개봉하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겹쳤던 ‘더 킹’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땐 그나마 박근혜 탄핵 전 아닌가. 대중이 정치 혐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특별시민’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오히려 정치 혐오를 심화하려는 의도로 오독할까 봐 걱정이다.
-영화 뚜껑을 열기 전까진 선거판이 주인공인 줄 알았다.
‘불신지옥’도 비슷한 경우인데, 굉장히 잘 만든 오컬트 영화인데 포장은 공포영화였거든. 우리도 인지도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선거라는 소재를 앞세웠다. 영화는 권력욕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다.
-변종구를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정치 9단으로서의 존경심, 정치인의 환멸 사이에 무게중심을 잡는 게 관건이었다.
그 지점이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특별시민’은 현실에 발 붙어 있는 영화다. 실제 꼭 있을 법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하더라도 변종구를 악마처럼 그리고 싶진 않았다. 유권자들을 속여서 국회의원 3선까지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 그 안엔 변종구의 나름의 진정성이 드러난 장면도 있다. 가령 박경(심은경)에게 초선 때 받은 국회의원 시계를 주는 장면처럼.

-연설 장면의 호소력이 어마어마했다. 절로 변종구에 한표 던지고 싶더라.
내가 유권자라도 찍고 싶은 정치인으로 그리고자 했다. 하지만 변종구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지지율 올라가는 것 봐라. 도가니탕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하잖아. 그게 변종구의 진짜 모습인 거지.
-최민식은 오랜만의 현대극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살을 쏙 뺀 얼굴을 보여준다. 덕분에 최민식의 연기가 더 실감 나게 다가오더라. 감독의 의도였나.
1일 1식 하며 뺐다더라. 변종구는 이탈리아 베를리루스코니 총리를 모델로 했다. 악덕 정치인인데 옷도 잘 입고 멋쟁이다. 변종구도 섹시하게 그리려고 했다. ‘특별시민’은 시나리오 쓸 때부터 최민식 선배를 떠올리며 썼다. 최민식이 있었기 때문에 변종구가 탄생했다. 유권자를 홀리는 과정에서 형님의 다양한 얼굴이 드러나길 바랐다.
-실제 정치인을 참고하거나 취재해 반영한 부분도 있나.
전혀. 오히려 누가 연상되길 바라진 않았다. 정치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포괄적인 사례에만 접근했다. 변종구는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인물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변종구가 문래동 공장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는 방식과 닮았다. 시기는 영화 촬영이 먼저였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인 거지.
-선거 캠프 구조도 인상적이었다. 국내에선 보기 드문 복층 구조다.
해외 선거 캠프 사례를 참고했다. 복층 구조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선거 캠프를 모티브로 했다.
-당색깔도 고민 많았겠다. 실제 특정 정당이 연상되면 안 되니까
정말 힘들었다. 오죽하면 그라데이션까지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미 있더라니까. 그렇다고 검정색을 쓸 수도 없고. 변종구 캠프도 당색깔은 빨간색, 선거 캠프 점퍼는 파란색이다.

-변종구와 박경의 관계는 카메라 밖 최민식, 심은경의 실제 모습과도 닮아 있다.
정치 초년 박경은 정치 베테랑 변종구를 두려워하면서도 할 말은 한다. 그 지점이 (심)은경이와 같다. 최민식 앞에서 주눅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에너지에서 밀리면 안 되는 싸움을 하잖아.
-특별출연한 계봉식 역의 박혁권의 존재감도 돋보였다. 남성의 주요부위(?)를 만지는 습관은 박혁권의 애드리브였다고.
식당이나 화장실 앞에서 자주 보이는 습관이잖아. 우리끼린 재밌다고 했는데, 여성 관객분들이 극도로 싫어하더라.(웃음)
-정치기자 정제이(문소리)와 변종구 사이 미묘한 관계가 생략된 것 같더라.
무슨 얘긴지 안다. 싱크홀 천막 안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말하는 것 아닌가. 정제이는 정치욕에 불타는 여자인데,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다.
-먹는 게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한다.
먹는 게 곧 권력이다. 아기 보살(김수안)이 변종구에게 게를 먹여주고, 변종구가 정제이에게 낫토를 먹여주려 했더니 발냄새난다고 싫다고 하잖아. 먹여주는 행위 자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변종구의 단골 고깃집은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설정과 닮았다.
정치드라마 틀 안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틀이 있다. 맞다.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도 주인공 프랭크가 단골 고깃집 사장을 백악관에 취직시켜준다. 우리 영화에서는 변종구가 고깃집 엄마를 시립 병원으로 옮겨주고. 따라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정치인들을 보면 누구나 단골 식당이 있더라. 정치인 역시 공인이니 함부로 행동을 못하잖아. 단골 식당은 그들만의 사적 영역인 거지.

-엔딩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평이 있다. ‘올드보이’나 ‘악마를 보았다’가 떠오르기도 하더라.
촬영할 때부터 너무 ‘올드보이’ 같지 않냔 의견이 있긴 했다. 하지만 배우가 가진 탈이 그것 아닌가. 관객들에게 ‘가서 빨리 투표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무 쉽게 가는 상업영화에 대한 염증이 있었다. 나는 ‘더 킹’도 재밌게 봤다. 새로운 시도들이 신선했다. 아무리 상업영화라 하더라도 영화적 표현에 대한 욕망은 있다.
-‘모비딕’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사회문제를 소재로 했다.
영상원 졸업영화로 탈북 영화를 찍었는데,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영화 끝나고 웬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내 손을 꽉 잡고 고맙다고 하더라. 순간 ‘이건 무슨 감정이지?’ 싶었다.
-차기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
아니다. 다음 영화가 어떤 장르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밝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계봉식의 스핀오프는 어떤가. 버리기 아까운 캐릭터인데.
‘기쿠지로의 여름’ 같은 밝은 야쿠자 영화로? 생각해보겠다.(웃음)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및 영화 ‘특별시민’ 스틸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영 시작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번주 스타트업]](https://d3fpdiit4h0p2n.cloudfront.net/nate-view/2024/11/27182844/CP-2023-0094-18659832-thumb-240x16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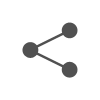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