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 칸(프랑스)=김수정 기자] 박찬욱은 박찬욱이었다. 문제작 하나씩은 나오게 마련인 칸영화제이지만 올해는 유독 조용했다. 페스티벌이 중반을 달해가고 있는 지금, 호평과 호평이 동시에 쏟아진 박찬욱의 ‘아가씨’가 심심했던 칸영화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아가씨’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아가씨를 둘러싼 네 남녀의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스토커’로 할리우드 제작 시스템을 혹독(?)하게 겪은 박찬욱 감독의 7년 만의 한국영화 복귀작이다.
동성 베드신, 가학적 성행위, 신체절단…. 박찬욱 영화를 구성하는 DNA 중 빼놓을 수 없는 ‘파격’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하지만 “깨알 재미가 많은 영화”라는 감독의 설명대로, 영화 곳곳에 숨은 블랙 코미디를 찾아보는 것 또한 ‘아가씨’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다. 명쾌한 해피엔딩도 기존 박찬욱의 영화들과 사뭇 다른 지점이다.
“전쟁영화에 전쟁 장면이 등장하는 것처럼, 동성애자의 사랑을 그렸으니 동성 베드신은 당연히 필요했다”라는 박찬욱의 설명처럼 ‘아가씨’의 동성 정사는 분명 ‘헉’소리 날 만큼 파격적이다. 하지만 뜨거운 관능과 온몸을 던진 배우들의 열연에 동성이니, 이성이니 하는 잣대는 무의미해진다.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찬욱이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영화에 대한 현지 반응은 격렬하게 나뉘고 있으나, 이는 ‘올드보이’와 ‘박쥐’ 때도 마찬가지였다. ‘깐느박’ 박찬욱에게 수상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효, 그 깐느박이라는 게 류승완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건데. 창피해요 정말.(좌중폭소) 수상은 전혀 기대 안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칸영화제에서 상을 주기엔 너무 대놓고 상업영화예요. 경쟁부문 진출도 의외였습니다. 일단 18일에 여행을 가려고요. 저도 좀 쉬어야죠. 만약 (폐막식) 부르면 다시 와야죠.(웃음)”
■ 다음은 박찬욱 감독과 일문일답
-드디어 프레스, 공식 상영까지 마쳤다. 큰 산을 하나 넘겼는데 기분이 어떤가
기술의 발전으로 소리, CG, 색깔 등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너무나 미세하 관객들 대부분은 모르는 것들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다듬을 수 있는 것들이라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었다. 출국 직전까지도 고치고, 또 고쳤다. 그럼에도 내 눈엔 결함이 보이더라.

-원작인 ‘핑거 스미스’를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핑거 스미스’를 안 읽었다면 모르겠는데, 읽었다면 누구나 영화로 만들고 싶었을 거다. 1부 반전이 끝났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내가 모든 걸 주도해서 상대바을 속이고 있고,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는 것 아닌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잘난 척해도 실상은 아닌 경우가 많다. 여기에, 사랑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봤다.
-두 여성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게 관건이었을 것 같다.
‘올드보이’의 정사신도 마찬가지였지만, 각색 과정부터 ‘세게 찍어야지’, ‘매력적으로 찍어야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령, 전쟁영화에 전투신이 꼭 필요하듯, 동성애자가 주인공이면 동성애 장면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동안은 검열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동성애를 그리지 못했다면, 이젠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면 해야지.
-남성 연출자로서 여성 동성애를 그리는 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남자가 레즈비언 정사에 갖는 판타지가 영화에 담길 수 있잖나.
맞다. 사실 고민하다가 말았다. 고민한다고 해서 선입견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물론 남자의 입장에서 여성 동성애를 에로틱하게 그리려는 건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했다. 말하자면 남성의 관음적인 시선은 지양했다.
-당초 시나리오에서는 김태리가 했던 남장을, 김민희로 바꿨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태리에게 남장을 시켰더니 정말이지 우스꽝스럽더라. 애 같았다, 애. 태리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기도 한데다 수염까지 붙여놓으니 학예회 같더라. 폭소가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보통 동성 커플이 있으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 역할이야라는 얘길 하잖아.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싶었다. 어느 순간엔 히데코(김민희)가 주도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엔 숙희(김태리)가 능동적으로 끌고 나가기도 하잖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헷갈리게 하고 싶었다.
-‘올드보이’의 산낙지에 이어 이번엔 문어가 등장한다.
의도한 건 아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칸영화제에 와서 알았다. 서양 관객들은 문어와 산낙지를 디테일하게 구분하진 못하더라. 내가 스스로 내 작품 중 유명한 장면을 이용한 건 절대 아니었다. 내 상상력 안에서 가장 역겹고 끔찍하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소재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문어를 떠올렸던 것뿐이다.

-여배우를 발탁하는 눈이 남다르다. 김태리도 보통 배우는 아니더라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태리가 자랑스럽다기 보다 태리를 발견한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좌중폭소) 농담이고, 다른 감독이 태리를 봤어도 대번에 골랐을 정도로 돋보였다.
-어떤 점이 그리 돋보였나
우선 주눅 드는 게 없다. 태리는 속으로 엄청 떨었다고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무조건 ‘네, 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첫 만남부터 자기 생각을 당차게 밝히더라. 사실, 지금 돌이켜 보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직감으로 캐스팅했다.
-어느 순간 애칭이 ‘깐느박’이 됐다. 수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부담스럽진 않나
아효, 깐느박은 류승완이 시작한 건데 창피해 죽겠네.(웃음) 수상은 전혀 기대 안 한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다. 영화제가 상을 주기에는 너무 상업적인 영화라고 생각한다. 경쟁에 초대한 것도 굉장히 의아했다.
-칸엔 언제까지 있나
일단 18일에 여행 간다. 나도 좀 쉬어야지.
-‘박쥐’ 때도 여행 중에 수상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돌아왔다.
하하. 맞다. 이번에도 오라고 하면 와야지.(웃음)
칸(프랑스)=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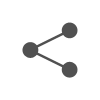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