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박설이 기자]<박설이의 막후TALK> 막후(幕後)의 사람들, 나오는 사람이 아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페이스 공감’ 황정원 PD, 김효정 작가, 나경호 작가
대학 과실 혹은 동방처럼 꾸며진 작은 무대 위로 자신을 조연출이라고 소개한 점프슈트 차림의 남자가 올라와 공연 시작 전 안내 사항을 얘기한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지만 ‘스페이스 공감’ 공연장에는 퍼모머 제외 모두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5월 기준). 무대와 객석이 매우 가깝다는 게 이유다. 혹여 객석에, 혹은 무대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 옮길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거리다.
현 시점 코로나19는 조심해야 하기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불편함 하나 말고는 EBS ‘스페이스 공감’에의 객석과 무대 거리에는 장점만 가득하다. 그 어느 무대보다 퍼포먼은 팬을, 팬은 최애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스페이스 공감’ 최고의 매력 포인트다.
옆으로 길고 무대를 살짝 감싸는 형태의 객석, ‘스페이스 공감’ 공연장 은 180명, 보조석을 설치하면 최대 200명 정도에게만 허락되는 작은 공간이다. PD와 그 주 뮤지션을 담당한 작가 등 제작진에게 촬영이 시작된 뒤의 공연장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부조실에서 공연을 지켜보고, 아니 만들고 있다.
‘스페이스 공감’ PD와 작가는 출연자 선정부터 공연 후 방송이 나가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황PD는 그래서 “찍어서 내기만 한다”는 오해가 퍽 섭섭하다. 금요일 공연이 끝나면 바로 주말이지만 편집, 음향 등 할 일은 더 많아진다. 퍼포머야말로 촬영이 끝나면 끝이지만, 제작진에게는 지난한 작업의 시작이다.
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스페이스 공감’ 공연장에서 직접 관람한 이튿날 황정원 메인PD, 김효정, 나경호 작가를 고양시 일산 EBS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날 또 공연이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만난 세 사람, 격무에 시달린 듯 기운이 없어 보였던 김효정 작가는 “드니성호 편 정말 좋았다”라는 기자의 말에 “정말 좋죠?”라며 목소리의 텐션을 높였다. 안타깝게도,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나눈 대화였지만.
Q_생각보다 현장에 카메라가 정말 많더라.
스튜디오 카메라 6대, ENG 카메라 2~3대, 고정 거치까지 15대 정도 된다. 라이브의 감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보니 여러 카메라 소스가 필요하다. 공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현장감을 주는 카메라를 곳곳에 배치해 뒀다.
Q_퍼포머 선정 기준이 궁금하다.
황 PD : 신보와 공연 소식을 늘 모니터한다. 한 달에 한 번 기획위원, 작가 3인과 기획회의를 진행해 다음달 어떤 라인업을 꾸릴까 같이 고민한다. 출연 요청을 해주신 분들도 많고, 신보가 나오면 CD도 다 보내주신다.
Q_섭외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부분이 있나?
황 PD : 기획위원이 다 음악 평론가, 공연장 대표 등 음악계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음악적 완성도를 살핀다. ‘스페이스 공감’은 한 시간짜리 공연이다. 그래서 1시간 라이브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180명 관객을 모객할 수 있는 뮤지션인가를 확인한다. 우리는 대중음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르는 음악이었지만 우리 방송을 통해 (대중이) 이 뮤지션을 좋아할 수 있게 할만한 뮤지션을 초대한다.

Q_객석엔 어떤 관객을 초대하나?
나 작가 : 500자 내외로 사연을 적을 수 있다. 거기서 하나씩 읽어보고, 꼭 올 것 같은 분, 간절한 분들을 본다. 보통은 (퍼포머의) 팬이다.
또 페이지 서버를 보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당첨되고) 얼마나 왔는지 다 볼 수 있다. 사연이 뽑혔는데 노쇼를 했던 적이 있는 분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사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어주시면 된다.
황 PD : 홍보 담당 스태프가 관람자 선정을 한다.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 친구의 마음을 울리는가다(웃음). 프로그램 이름도 ‘공감’이지 않나. ‘스페이스 공감’은 팬이 아닌 일반 관객을 팬으로 만들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팬과 팬이 아닌 관객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유다. (새로운 뮤지션을) 접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유료 공연을 가기 전 무료 공연을 통해 가까이서 뮤지션의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나. 공연 문화 자체를 접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김 작가 : ‘스페이스 공감’ 홈페이지를 관심 갖고 보시다가 ‘이런 뮤지션이 있었네?’ 하고 방청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다.
나 작가 : 50대 중반 쯤 되는 분이 계시는데 파일 폴더에 프로그램지를 모으시더라. 아티스트의 팬이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취미로 ‘공감’에 방청 신청을 하고 관람을 하신다. (‘공감’이 택한 뮤지션을) 믿고 듣는 느낌으로 보시는 듯하다.
Q_섭외가 완료되면 다음은? 세트리스트는 어떻게 정하나?
황 PD : 먼저 뮤지션과 미팅을 진행한다. 이 공연을 통해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 콘셉트를 얘기한다. 그에 따라 세트리스트와 무대 콘셉트도 얘기한다. 세트리스트를 최종 확정하는 건 거의 뮤지션이다. 회의를 바탕으로 무대 디자이너, 촬영팀, 조명팀 등 스태프들과 비주얼 콘셉트 회의를 한다. 공연 당일에 공연하고, (공연 중간중간 들어갈) 인터뷰도 진행한다. 리허설과 공연 시작 전 시간까지 알차게 활용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다.
재미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싶을 때 추가 촬영을 하기도 한다. 마이앤트메리 공연 때였는데, 2000년대 한창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온 밴드라 팬들도 나이가 있다. 관람객의 밴드와 얽힌 사연을 추가로 촬영하기도 했었다.
Q_카메라가 많은 걸 보니 후반 작업도 만만치 않겠다.
황 PD : 녹화 후 방송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편집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공연장 사운드를 방송용으로 믹싱하고, 십수 대 카메라로 찍은 컷을 편집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구성은 작가들이 사후에 한다.
Q_아티스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김 작가 : 정해진 구성은 없다.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때 뮤지션이 하는 답변을 들으면 이번 공연을 통해, 또는 앨범을 통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하는지 보인다. 그걸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매편 매회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름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작가 : 미리 생각을 하더라도 당일 촬영할 때 100% 안 나올 때도 있다. 최대한 많은 소스를 확보하고 그것을 보면서 잘 엮고 있다. 그래서 사후 작업이 많다. (공연장) 프롬프터도 소속사에서 운영을 한다. 무대 위 모든 멘트는 아티스트가 하는 거다. (세트리스트 외에) 대본은 없다.
Q_연출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황 PD : 뮤지션의 음악을 시청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션을 사랑하게 하는 게 목표다. 그들의 음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공연장의 라이브감을 어떻게 TV에서 잘 보이게 할까 고민한다. 뮤지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시청자가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인터뷰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인터뷰에서 재미난 구성을 해보기도 한다. 진지한 사람이면 우리도 진지하게, 다른 매체나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매력을 한껏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Q_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좋아지는 뮤지션도 있겠다.
황 PD : 우리는 매번 사랑에 빠진다. 제작진 모두 음악을 좋아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다. ‘내가 모르는 음악이 이렇게 많았다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편협했구나 느낀다. 스태프들도 그 뮤지션을 정하게 되면 끝날 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걸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작가 : 대중에게 찾선 뮤지션이 출연할 때는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이해를 한다. 방송 후기를 보면 ‘작가가 팬인 것 같다’라는 게 간혹 있는데 그게 굉장한 칭찬으로 들린다. 뮤지션의 사소한 말 한마디, 인터뷰할 때 사용한 배경음악 선정 같은 것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사진=EBS
인터뷰②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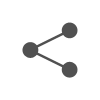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