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 싱가포르=김수정 기자] 얄밉도록 똑똑한 마블이다.
마블은 히어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가 아니다. 2008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페이즈1 서막을 연 ‘아이언맨’과 ‘어벤져스’ 시리즈, ‘앤트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 수년간 여러 개별 프랜차이즈를 통해 MCU를 탄탄히 쌓아올렸다. 개별 프랜차이즈에서 구축된 MCU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정점을 찍었다.
마음 급한 DC코믹스도 히어로가 총출동하는 ‘저스티스의 리그’의 제작을 결정하며 뒤늦게 칼을 뽑았지만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저스티스의 리그’ 전초전인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잭 스나이더 감독)을 론칭했으나 엄청난 혹평만 남겼다. 마블이 수년간 해온 일을 한 작품 안에 우격다짐으로 쏟아 넣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제작될 DC코믹스 히어로물의 예고편 선물세트와도 같았던 ‘배트맨 대 슈퍼맨’의 불안한 출발로 ‘저스티스 리그’ 파트1과 2를 연출하게 될 잭 스나이더 감독 교체 청원까지 일었다.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안소니 루소, 조 루소 감독)는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아이언맨 팀과 반대하는 캡틴 팀으로 나뉘어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번 작품은 정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계기로 서로 다른 가치관이 대립하게 됐다는 점, 두 진영을 오가는 빌런의 이간질이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과 상당 부분 닮았다.
하지만 두 영화가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이해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 DC가 두 히어로가 싸우고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을 너무나 단순하게 그려내 관객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했다면, 마블은 오히려 액션보다 드라마에 방점을 찍는 승부수를 뒀다. DC가, 아니 잭 스나이더가 화려하고 웅장한 액션신이 히어로물의 진수라고 봤다면 루소 형제는 촘촘한 드라마와 캐릭터에 좀 더 힘을 줬다. 서로 다른 캐릭터의 히어로들이 빚어내는 액션의 쾌감은 드라마라는 기초공사가 끝난 후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의 조 루소 감독은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드라마에 공을 들이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지만 히어로 포화상태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며 “히어로 장르를 변주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 이번 영화로 드라마, 페이소스, 유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영화를 보면 조 루소 감독의 말이 괜한 자신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로 MCU 페이즈3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마블은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 팬서’, ‘캡틴 마블’, ‘앤트맨 앤 와스프’, ‘인휴먼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등 무려 10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로 더 이상 히어로물이 단순히 볼거리 위주의 장르가 아닌, 잘 만든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마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이들의 우주가 기대되는 이유다.
싱가포르=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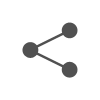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