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양원모 기자] 대표의 탐욕이 손님들의 죽음을 불렀다.
16일 오전 MBC 예능 프로그램 ‘신비한TV 서프라이즈 – 빌런극장’에서는 죽음의 놀이공원 ‘액션 파크’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1978년 미국 뉴저지주(州)에 문을 연 액션파크는 30만 2500만명(100만㎡)의 거대한 면적에 70개가 넘는 다양한 놀이기구로 매년 100만명이 찾는 지역 명소였다. 그러나 개장 이후 각종 사건사고로 ‘죽음의 놀이공원’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
첫 번째 사망자는 1980년 발생했다. 뉴욕시에 살던 조지 라슨 주니어가 썰매를 타고 820m를 내려오는 ‘알파인 슬라이드’를 타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바위와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 개장 이래 발생한 첫 번째 사망자였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튜브를 타고 급류를 내려오는 ‘로어링 스프링스’의 탑승객이 수중 프로펠러의 전선을 잘못 밟아 감전사하는가 하면, 타잔처럼 외줄을 타고 물웅덩이를 건너는 ‘타잔 스윙’에서는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가장 위험한 놀이기구는 ‘파도 풀’. ‘안전요원 의자’가 ‘죽음의 의자’로 불릴 만큼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최대 3m 깊이의 풀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갔기 때문. 파도 풀에서만 10대 소년을 포함 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액션 파크 개장 이후 9년 동안 발생한 사망자만 9명. 매일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자 액션 파크는 어느새 “목숨을 걸어야 하는 놀이공원”이라는 악명이 생겼다.
그러나 이 모든 사고는 ‘불운’이 아닌 ‘인재(人災)’였다. 창업자 진 멀비힐의 만행에서 비롯된 예정된 비극이었던 것.
증권 거래인 출신인 멀비힐은 뉴저지의 한 스키 리조트를 인수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액션 파크를 개장했다. 사계절 내내 돈을 벌려면 스키 리조트가 아닌 워터파크가 있는 놀이공원이 낫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비전문가인 자신이 모든 놀이기구를 설계하고, 전문가 안전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 15m 높이에서 떨어져 360도 회전하는 워터 슬라이더 ‘캐논볼 루프’는 회전 구간에서 최대 9G의 중력 가속도를 받을 만큼 위험천만한 기구였다. 9G는 전투기 조종사가 받는 최대 힘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멀비힐은 “사고는 기구 때문이 아니라, 이용객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운영을 강행했다.
특히 액션 파크 직원 대부분 10대로 구성됐는데, 미성년자 인건비가 더 싸기 때문이었다. 멀비힐은 심지어 친자녀들까지 근무에 투입했다.
여기에 매상을 높이기 위해 미성년자들에게도 신분증 확인 없이 마구잡이로 술을 팔았다. 당시 액션 파크를 방문했다는 크리스 제사드는 “꼭 술에 취한 10대들이 운영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 밖에도 멀비힐은 소송에 대비해 유령 보험회사를 개설,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만 지급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멀비힐의 악행은 1994년 그가 보험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상에 드러냈다. 액션 파크도 2년 뒤 폐장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영상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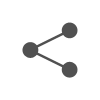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