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새 박사 윤무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장례를 준비하란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며 새를 보기 위해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11일 MBN ‘특종세상‘에선 국가대표 새 박사로 유명했던 윤무부의 근황이 소개됐다. 휠체어를 타고 천변에서 카메라로 새의 모습을 담는 그의 모습. 뇌졸중 이후 불편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새에 대한 관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천변에서 만난 아이에게 “새를 사랑하고 새를 연구하는 새 박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새를 보고 난 후에 전동 휠체어를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53년 동안 자신의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아내였다.
조심스레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고 아내는 익숙한 듯 남편을 부축했다. 윤무부는 방에 꾸민 연구실을 공개했다. 카메라를 모니터에 연결한 그는 새의 영상을 보며 아직도 연구중이라고. 새 박사 윤무부의 호출에 아내는 남편이 전국을 다니며 녹음한 새소리가 든 자료를 찾아오며 특급 조수 역할을 했다.
“새가 기다리는 것 같다”라며 탐조 활동을 나가는 남편에게 아내는 “그건 당신 마음이야. 기다리는 새 없어”라며 불편한 몸에도 새를 보러 다니는 남편 행동을 불안해했다.
아내가 탐조 화동을 말리는 이유에 대해 윤무부는 “2006년도에 강원도 철원 갔다가 새 보다가 추워서 뇌경색이 왔다. 10년 넘었다. 메스껍고 토할 것 타고 어지럽고 대개 약 먹으면 괜찮은데 그 날은 말을 안 듣더라.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가 너무 늦었대, 뇌경색은 3시간 이내에 와야 고친대. 그런데 3일 만에 가니까 의사들이 고개를 흔들어.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그때부터 말도 안 나오고 마비가 됐다”라고 털어놨다.
2006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는 그는 “의사가 오더니 장례준비를 하라고 하더라. 내 귀에 들리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뇌졸중으로 인해 온몸이 마비됐지만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윤무부는 “나는 새 때문에 죽어라고 운동을 했다. 새를 봐야한다. 나는 새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 오른쪽도 못쓰고 외쪽도 약간 마비됐다. 1년 동안 콩 100개를 놓고 하루종일 젓가락으로 집어서 그릇에 옮기는 훈련을 했다. 그걸 1년 더 했다”라고 밝혔다.



투병 중에도 새를 보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는 부부. 그런 행보에는 아내의 공이 컸다고.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왜냐면 화장실도 못가지, 목욕시켜주지.. 옷 갈아입혀주지 우리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자신을 물심양면 돌보고 뒷바라지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가 차린 밥상 앞에서도 “촬영가면 무슨 새를 찍을까 그런 생각 한다”라고 새 생각뿐인 일상을 드러냈고 “새 계속 보셨는데 계속 보고 싶은 새가 있는 거냐”라는 제작진의 물음에 “그게 이상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새가 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아내는 “계절이 오면 ‘그 새는 이때쯤 올 거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만날 나가고 싶어 한다. 그 새가 부른다고 한다”라고 남편의 새 사랑을 언급했다.
이어 새 박사 윤무부는 아내 몰래 홀로 경주 여행에 나섰고 후투티를 카메라에 담으며 “나의 첫사랑”이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새는 나의 생명과 같다. 새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새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특종세상’ 방송 캡처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영 시작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번주 스타트업]](https://d3fpdiit4h0p2n.cloudfront.net/nate-view/2024/11/27182844/CP-2023-0094-18659832-thumb-240x16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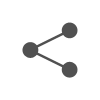
댓글0